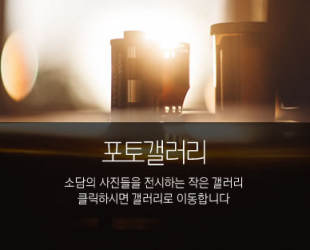2024.01.16 pm 04:24
본문

01.16
Tuesday 16:24
우리 집에서 논길을 돌아 산 밑에 뚝 떨어진 집에 살았는데 말수가 적고 표정도 거의 없어
어쩌다 웃을 때면 신기하게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.
늘 조용해 있는 듯 없는 듯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
나이보다 성숙해 철없던 우리보다 한참은 누나 같은 친구였습니다.
고등학교 진학하며 읍내로 이사를 나왔지만 지금도 명절이면 동네를 찾으니
안부를 알고 싶다면 그리 어렵지는 않을 듯합니다.
그 시절엔 농사일 아니면 땅따먹기나 하고 놀던 지겹기만 했던 동네가
지금은 세상 가장 평온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.
국민학교 친구들도 지금 생각하니 모두 순박한 천사 같았습니다.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